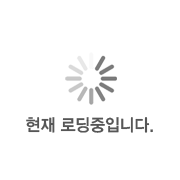 |
| 所以 > 원인/도구 | A 之所 B | A가 B한 것은 ; A가 B한 것이다 | |
|
대표 : 所以 A
동의 : 亡以 A ; 無所 A ; 無以 A ; 未有以 A ; 非有以 A ; 所由 A ; 所以 A ; 所以 A 者 ; 緣 A 故也 ; 由 A 故也 ; 有以 A ; 以 A ; 以 A 故也 ; 以 A 者 ; 以 A 者也 ; A 之所 B ; A 之所以 B 也 ; A 之所以 B 者也 ; 以 A 者則以 B ; A 之所 B ; A 之所以 B ; A 所以 B ; A 所以 B 也 ; A 所以 B 之法 ; A 所以 B 之術 ; A 以 B 也 ; A 者 所以 B ; A 者 所以 B 也 ; A 者 B 故也 ; A 者 B 也 ; A 者 B 之所 C 也 ; A 者 B 之所以 C 也 ; A 者緣 B 故也 ; A 之 B 也 以 C ; A 之 B 以 C 也 ; A 之所 B 者 C 也 ; A 之所以 B 者 ; A 之所以 B 者 以 C ; A 之所以 B 者 以 C 也 ; A 之所以 B 者 C 也 ; 所 A 者 爲 B 也 ; 所 A 者 以 B 也 ; 所以 A 以 B ; 所以 A 者 爲 B 也 ; 所以 A 者 以 B ; 所以 A 者 以 B 也 ; 所以 A 者 B ; 所以 A 者 B 也 ; 以 A 者 以 B 也 ; A 之所以 B 者 C ; |
|||
| 以는 A한/할 것으로 所以(까닭/원인/도구/방법)의 생략형이다. ‘A 之所 B’는 주어나 술어에 모두 쓰인다. |
|||
| 22 개의 글에 글자가 검색되었습니다. | ||
|---|---|---|
| 1 | 是人之所欲也 <漢文독해기본패턴, 三字~八字 풀이 패턴> | |
| 이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다. | ||
| 2 | 貧且賤이 非所羞也요 學道而不行之誠所羞也라 <[新編]明心寶鑑, 韓國篇> | |
|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를 배우고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진실로 부끄러운 것이다. | ||
| 3 | 說苑云 財者君子之所輕이요 死者小人之所畏라 <[新編]明心寶鑑, 中國篇> | |
| 《설원》에 말하였다. “재물은 군자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죽음은 소인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 ||
| 4 | 上有天하고 下有地하니 天地之間에 有人焉하고 有萬物焉하니 日月星辰者는 天之所係也요 江海山嶽者는 地之所載也요 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者는 人之大倫也니라 <啓蒙篇, 首篇> | |
|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으니, 하늘과 땅의 사이에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만물이 있으니, 해와 달과 별은 하늘이 매달고 있는 것이고, 강과 바다와 산은 땅이 싣고 있는 것이고, 부자 〈간의 친함,〉 군신 〈간의 의로움,〉 부부 〈간의 분별,〉 어른 아이 〈간의 차례,〉 벗 〈간의 신의〉는 사람의 큰 윤리이다. | ||
| 5 | 孟子曰 讀其書하고 誦其詩하되 不知其人이 可乎아하시니라 余幼時에 見人家子弟初學者가 無不以是書爲先하되 而第不知出於何人之手矣러니 今朴上舍廷儀氏 來謂余曰 此는 吾高祖諱世茂之所編也라하니 余不覺驚喜曰 今日에 始知其人矣와라 <童蒙先習, 跋文> | |
| 맹자가 말하길 ‘그 글을 읽고 그 시를 외우면서도 그 〈글 쓴〉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옳은가?’ 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에 다른 집의 초학자인 자제들을 보았더니 이 책을 먼저 배울 것으로 삼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다만 〈이 책이〉 어떤 사람의 손에서 나왔는지 몰랐었다가, 이제 상사 박정의 씨가 찾아와서 나에게 일러 말하길, ‘이 책은 나의 고조부 휘 세무(世茂)께서 엮은 것이다.’ 하니, 나는 자신도 모르게 놀라고 기뻐하며 말하길, ‘오늘에야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게 되었구나!’ 하였다. | ||
| 6 | 池魚之殃: 宋桓司馬有寶珠한대 抵罪出亡이라 王使人問珠之所在하니 曰 投之池中이라하다 於是에 竭池而求之하나 無得하고 魚死焉이라 <原文故事成語, 處世> | |
| 연못 물고기의 재앙 : 송나라 사마 환퇴가 보배로운 구슬을 가졌는데, 죄를 지고서 달아났다. 왕이 사람을 보내 구슬이 있는 곳을 물으니, 〈환퇴가〉 말하였다. “구슬을 연못 속에 던졌습니다.” 이에 연못을 말려서 구슬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물고기만 죽게 되었다. | ||
| 7 | 刻舟求劍: 楚人에 有涉江者라 其劍自舟中墜於水하니 遽契其舟曰 是吾劍之所從墜라하고 舟止하니 從其所契者入水求之라 舟已行矣나 而劍不行하니 求劍若此면 不亦惑乎아 <原文故事成語, 愚鈍> | |
| 8 | 秦之間言曰 秦之所惡는 獨畏馬服君趙奢之子趙括爲將耳라하다 趙王因以括爲將하여 代廉頗라 藺相如曰 王以名使括은 若膠柱而鼓瑟耳니이다 括徒能讀其父書傳이요 不知合變也니이다하다 趙王不聽하고 遂將之라 <原文故事成語, 愚鈍> | |
| 9 | 杞人之憂: 杞國有人이 憂天地崩墜하면 身亡所寄하여 廢寢食者라 又有憂彼之所憂者하여 因往曉之曰 天積氣耳며 亡處亡氣라 若屈伸呼吸하며 終日在天中行止한대 奈何憂崩墜乎아하니 其人曰 天果積氣면 日月星宿도 不當墜邪오하다 <原文故事成語, 愚鈍> | |
| 10 | 緣木求魚: 曰 王之所大欲을 可得聞與잇가 王笑而不言하신대 曰 爲肥甘不足於口與며 輕煖不足於體與잇가 抑爲采色不足視於目與며 聲音不足聽於耳與며 便嬖不足使令於前與잇가 王之諸臣이 皆足以供之하시니 而王豈爲是哉시리잇고 曰 否라 吾不爲是也로이다하다 <原文故事成語, 愚鈍> | |
| 11 | 曰 然則王之所大欲을 可知已니 欲辟土地하며 朝秦楚하여 莅中國而撫四夷也로소이다 以若所爲로 求若所欲이면 猶緣木而求魚也니이다하다 王曰 若是其甚與잇가하니 曰 殆有甚焉하니 緣木求魚는 雖不得魚라도 無後災어니와 以若所爲로 求若所欲이면 盡心力而爲之라도 後必有災하리이다하다 <原文故事成語, 愚鈍> | |
| 12 | 天下之士悅之는 人之所欲也어늘 而不足以解憂하시며 好色은 人之所欲이어늘 妻帝之二女하시되 而不足以解憂하시며 富는 人之所欲이어늘 富有天下하시되 而不足以解憂하시며 貴는 人之所欲이어늘 貴爲天子하시되 而不足以解憂하시니 人悅之와 好色과 富貴에 無足以解憂者요 惟順於父母라야 可以解憂러시다 <小學, 稽古第四> | |
| 천하의 선비가 좋아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이로써 근심을 풀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아름다운 여색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요임금의 두 딸을 아내로 삼았으면서 이로써 근심을 풀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부유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부유함이 천하를 소유하였으면서 이로써 근심을 풀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귀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귀함이 천자가 되었으면서 이로써 근심을 풀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좋아함과 아름다운 여색과 부유함과 귀함에 근심을 풀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오직 부모에게 순하여야 이로써 근심을 풀 수 있었다. | ||
| 13 | 梁惠王이 曰 晉國이 天下에 莫强焉은 叟之所知也라 及寡人之身하여 東敗於齊에 長子死焉하고 西喪地於秦七百里하고 南辱於楚하니 寡人이 恥之하여 願比死者하여 一洒之하노니 如之何則可니잇고 <四書독해첩경, 孟子> | |
| 양 땅의 혜왕이 말하였다. “진나라가 천하에서 그보다 강한 나라가 없는 것은 노인장이 아는 바입니다. 과인의 몸에 이르러, 동으로는 제나라에 패하여 맏아들이 거기에서 죽었고, 서로는 진나라에 칠백 리의 땅을 잃었고, 남으로는 초나라에 욕을 당하였으니, 과인이 이를 부끄러워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한번 그들에게 설욕하기를 바라니, 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
| 14 | 以天下之所順으로 攻親戚之所畔이라 故로 君子有不戰이언정 戰必勝矣니라 <四書독해첩경, 孟子> | |
| 천하가 따르는 사람으로 친척이 배반하는 사람을 공격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는 싸우지 않는 경우가 있을 망정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 ||
| 15 | 子之所愼은 齊戰疾이러시다 <論語, 述而第七> | |
| 공자가 조심한 것은 재계와 전쟁과 질병이었다. | ||
| 16 | 梁惠王이 曰 晉國이 天下에 莫强焉은 叟之所知也라 及寡人之身하여 東敗於齊에 長子死焉하고 西喪地於秦七百里하고 南辱於楚하니 寡人이 恥之하여 願比死者하여 一洒之하노니 如之何則可니잇고 <孟子, 梁惠王上> | |
| 양 땅의 혜왕이 말하였다. “진나라가 천하에서 그보다 강한 나라가 없는 것은 노인장이 아는 바입니다. 과인의 몸에 이르러, 동으로는 제나라에 패하여 맏아들이 거기에서 죽었고, 서로는 진나라에 칠백 리의 땅을 잃었고, 남으로는 초나라에 욕을 당하였으니, 과인이 이를 부끄러워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한번 그들에게 설욕하기를 바라니, 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
| 17 | 孟施舍之所養勇也는 曰 視不勝호되 猶勝也로니 量敵而後進하며 慮勝而後會하면 是는 畏三軍者也니 舍豈能爲必勝哉리오 能無懼而已矣라하니라 <孟子, 公孫丑上> | |
| 맹시사(孟施舍)가 용기를 기른 방법은 말하길 ‘〈나는〉 이기지 못할 자를 보되 이길 것 처럼 한다. 적을 헤아린 뒤에 나아가고 이길 것을 고려한 뒤에 싸운다면 이는 〈적의〉 삼군(三軍)을 두려워하는 자이다.’ 하였으니, 맹시사가 어찌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능히 두려움이 없었을 뿐이네. | ||
| 18 | 以天下之所順으로 攻親戚之所畔이라 故로 君子有不戰이언정 戰必勝矣니라 <孟子, 公孫丑下> | |
| 천하가 따르는 사람으로 친척이 배반하는 사람을 공격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는 싸우지 않는 경우가 있을 망정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 ||
| 19 | 然則子之失伍也亦多矣로다 凶年饑歲에 子之民이 老羸는 轉於溝壑하고 壯者는 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오 曰 此는 非距心之所得爲也니이다 <孟子, 公孫丑下> | |
| 〈맹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대가 대오(隊伍)를 이탈한 것이 또한 많습니다. 흉년으로 굶주린 해에 그대의 백성 중에 늙고 쇠약한 자는 도랑이나 골짜기에 〈시체로〉 나뒹굴고 장성한 사람은 흩어져서 사방으로 간 자가 몇천 명입니까?” 〈공거심이〉 말하였다. “이것은 제(거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
| 20 | 夫蚓은 上食槁壤하고 下飮黃泉하나니 仲子所居之室은 伯夷之所築與아 抑亦盜跖之所築與아 所食之粟은 伯夷之所樹與아 抑亦盜跖之所樹與아 是未可知也로다 <孟子, 滕文公下> | |
| 저 지렁이는 〈땅〉 위로는 마른 흙을 먹고 〈땅〉 아래로는 누런 물을 마시는데, 중자가 지내는 바의 집은 백이가 지은 것인가? 아니면, 도척이 지은 것인가? 먹는 바의 곡식이 백이가 심은 것인가? 아니면 도척이 심은 것인가? 이는 알 수 없다네.” | ||
| 21 | 孟子曰 爲政이 不難하니 不得罪於巨室이니 巨室之所慕를 一國이 慕之하고 一國之所慕를 天下慕之하나니 故로 沛然德敎가 溢乎四海하나니라 <孟子, 離婁上> | |
| 맹자가 말하였다. “정치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큰 가문에게 죄를 얻지 않는 것이다. 큰 가문이 사모하는 것 그것을 온 나라가 사모하고, 온 나라가 사모하는 것 그것을 천하가 사모하니, 그러므로 성대한 덕의 교화가 천하에 넘친다.” | ||
| 22 | 自是而又再傳하여 以得孟氏하여 爲能推明是書하여 以承先聖之統이러시니 及其沒而遂失其傳焉하니 則吾道之所寄는 不越乎言語文字之間이요 而異端之說이 日新月盛하여 以至於老佛之徒出하여는 則彌近理而大亂眞矣라 <中庸章句, 中庸章句序> | |
| 이때부터 또 거듭 전해져서 맹씨(맹자)를 얻어서는 〈맹자가〉 이 책(중용)을 미루어 밝혀서 지나간 성인의 도통을 계승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맹자)가 사망하게 되자, 마침내 그 전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으니, 우리 도(道)가 의지할 바는 언어·문자의 사이를 넘어서지 못하였으나, 〈도리어〉 이단의 학설은 날로 새로워지고 달로 성대해져서 노(老)·불(佛)의 무리가 생겨나는 데에 까지 이르러서는 더욱 도리에 가까워져서 〈우리 도의〉 참모습을 크게 어지럽혔다. | ||
Copyright @ (사)전통문화연구회 고전교육연구실